의약분업 10년 “진료따로 약따로 불편-불만족”
전의총, 의약분업 평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 등록 2010-11-18 16:25:24
진료와 약조제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 의약분업에 일반인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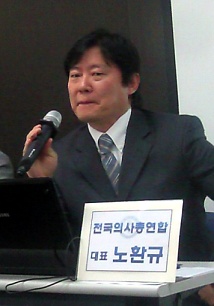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는 18일,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약 2개월간 일반인 총 12,214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환자 만족도와 편의성, 복약지도 여부, 일반약 수퍼 판매, 진료비와 약값, 약사의 조제료,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의약분업 10년 평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제도의 불편함이 크다고 느끼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약국에 새롭게 배정된 지출항목인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0.4%(6,156명)가 진료와 약조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의약분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4.5%(1,772명)만이 각각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 같아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또 의약분업전과 달리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이 불편한 것을 묻는 질문(편리성)에 총 36.4%(4,440)가 그렇다, 23.9%(2,922)명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이 없는자로 비교해 조사했을때는 역시 전체 과반이 넘는 이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처방 받은 의약품을 어디서 조제하길 원하냐는 질문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가 좋다고 대답한 이들이 42.1%(5,140)이고, 병·의원이나 약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도 이와 비등한 수치인 41.3%(5,047)가 응답했다. 즉, 병·의원 조제를 원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조제 장소를 선택하길 원하는 비율이 컸다.
만성질환 유무로 나누어 조사했을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중 53.3%가 병·의원 조제를 원했고, 병·의원이나 약국 중 선택할 수 있길 원하는 응답자는 31.8%(724명)이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국민 대다수가 현행 제도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원내조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의 결과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약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가 포함되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1%(10,514명)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고, 13.1%(1,675)만이 이를 주지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81.4%(9,940명)가 야간에 약국이 문을 답아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료비와 약값 중에서 어느것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의 36.5%(4,455명)가 ‘둘 다 부담된다’, 34.1%(4,166)명은 약값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0.4%(1,150명)가 약값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진료비 보다 높은 조제료와 높은 약품비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현행 고가의 복제약가제도의 개선과 조제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의미부여 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가 약사에게 조제에 대한 권한 일부를 위임한 조제위임제도인데 야간에 원내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는 현행 강제의약분업으로 야간에 약사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했다. .
아울러 전의총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단기간에 결과물 얻어야 겠다는 뜻에서 항목을 제한해서 평가 항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우 의미있다”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된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킨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는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만약 이를 이루지 못한채 국민적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의약분업이었다면 이는 선택분업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대국민 의약분업 평가가 진행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동정]유한양행, 23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수상
- [인사]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정진아 신임 개발본부장(CDO) 영입
- [부음]한원선 前 한원선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별세
- [동정]인천성모병원 이운정교수,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 [동정]충남대병원 박재호 물리치료사,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 [동정]경희대병원 여승근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 [동정]건양대병원 차아름 씨, 외국인 환자 유치 유공 대전시장 표창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오진경 교수, 대한내과학회 수여 ‘KJIM 최다인용 공로상’ 선정
- [동정]범석학술장학재단, 제29회 범석상에 김병극·김승현 교수 선정
- [부음]김권식 메디포뉴스 전무 빙모상
- [인사]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정진아 신임 개발본부장(CDO) 영입
- [인사]서울성모병원 장기육 교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 회장 추대
- [인사]영남대 영천병원, 제18대 박삼국 병원장 취임
- [인사]명지병원, ‘뇌졸중 전문가’ 최영빈 교수 영입
- [인사]동산의료원·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보직인사(2/1)
- [인사]삼성서울병원, 원장단 및 주요 보직 인사(2/1)
- [인사]배재훈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취임
- [인사]동화약품, 장재원 연구개발본부장 선임
- [인사]HLB 자회사 엘레바, 김동건 대표 선임
- [인사]서울대병원 우홍균 교수,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 취임
- [동정]유한양행, 23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수상
- [동정]인천성모병원 이운정교수,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 [동정]충남대병원 박재호 물리치료사,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 [동정]경희대병원 여승근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 [동정]건양대병원 차아름 씨, 외국인 환자 유치 유공 대전시장 표창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오진경 교수, 대한내과학회 수여 ‘KJIM 최다인용 공로상’ 선정
- [동정]범석학술장학재단, 제29회 범석상에 김병극·김승현 교수 선정
- [동정]인천성모병원 이순규 교수, 대한간암학회 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 [동정]명지병원 김민석 교수, 제62차 세계흉부외과학회 ‘Maxwell Chamberlain 논문상’
- [동정]고대 구로병원 병리과, 서울특별시장 표창·서울시의회 의장상 동시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