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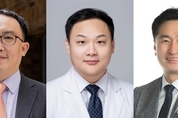
유방암 치료 후 검사 빈도 높으면 전이 조기 발견↑…생존율 향상은 ‘미미’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이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체 환자들의 원격 전이 검사 빈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빈도 검사군 ▲저빈도 검사군으로 나눈 후 9년 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며 생존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7.3%인 301명에서 원격 전이가 발생했으며, 고빈도 검사군이 저빈도 검사군보다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뼈·폐·간 전이에서 고빈도 검사가 조기 발견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돼 빈번한 검사가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방암 특이 생존율(BCSS) 분석에서는 고빈
- 김민준 기자
- 2024-09-30 15:00
-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로 ‘유방암 간 전이’의 새로운 메커니즘 규명
최근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유방암 간 전이’ 과정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유방암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을 이용해 유방암의 간 전이 과정에서 ‘CX3CL1’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방암세포가 혈액으로 분비하는 세포밖 소포체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간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규명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분자암연구(Molecular cancer research) 7월호의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문형곤 교수팀(허우행 연구원)이 한국인 유방암 환자의 암조직을 직접 면역이 억제된 쥐에 이식해 종양을 키운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patient-derived xenograft model, PDX model)을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유방암의 간 전이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 수행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2023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를 차지한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부분 유방암 환자의 원격 전이(원발 부위의 암보다는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의해 발생한다. 간은
- 이형규 기자
- 2023-08-09 12:16
- [인사]셀트리온그룹 임원승진인사 (2/13)
- [동정]인천성모병원 허휴정 교수, 지역 정신건강 증진 공로로 인천광역시장 표창
- [동정]고대 안암병원 김태훈 연구부원장,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수상
- [인사]이무식 교수, 제19대 건양의대 학장 취임
- [부음]류호경 나라치과 원장 장모상
- [동정]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정]유한양행, 23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수상
- [인사]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정진아 신임 개발본부장(CDO) 영입
- [부음]한원선 前 한원선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별세
- [동정]인천성모병원 이운정교수,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 [인사]셀트리온그룹 임원승진인사 (2/13)
- [인사]이무식 교수, 제19대 건양의대 학장 취임
- [인사]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정진아 신임 개발본부장(CDO) 영입
- [인사]서울성모병원 장기육 교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 회장 추대
- [인사]영남대 영천병원, 제18대 박삼국 병원장 취임
- [인사]명지병원, ‘뇌졸중 전문가’ 최영빈 교수 영입
- [인사]동산의료원·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보직인사(2/1)
- [인사]삼성서울병원, 원장단 및 주요 보직 인사(2/1)
- [인사]배재훈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취임
- [인사]동화약품, 장재원 연구개발본부장 선임
- [동정]인천성모병원 허휴정 교수, 지역 정신건강 증진 공로로 인천광역시장 표창
- [동정]고대 안암병원 김태훈 연구부원장,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수상
- [동정]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정]유한양행, 23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수상
- [동정]인천성모병원 이운정교수,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 [동정]충남대병원 박재호 물리치료사,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 [동정]경희대병원 여승근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 [동정]건양대병원 차아름 씨, 외국인 환자 유치 유공 대전시장 표창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오진경 교수, 대한내과학회 수여 ‘KJIM 최다인용 공로상’ 선정
- [동정]범석학술장학재단, 제29회 범석상에 김병극·김승현 교수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