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료 개선, 정부·광역지자체 역할 강화와 기금·예산 효율화 등 필요
지방 소멸과 의료기관 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을 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육성·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어내려면 광역지자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됐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가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희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과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패턴이 존재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 시 의료기관이 주변지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역이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 시 지방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였고, 상호 변수 간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 김민준 기자
- 2024-11-29 08: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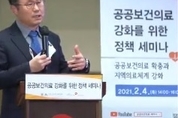
나백주 교수 “중장기 공공병원 현대화 계획 세워나가야”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지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그만큼의 대우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4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확진자가 막 생겨나기 초반에 민간병원은 병상을 비우게 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복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들 기피했다”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음압병실을 미리 갖고 있었고 민간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안 받으려는 것을 희생적으로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 교수는 “도정 또는 국정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병실확보나 역학조사관을 투입하는 부분들까지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공공병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 신대현 기자
- 2021-02-06 05:42
- [인사]HLB 자회사 엘레바, 김동건 대표 선임
- [동정]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백선하 교수,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수상
- [부음]이제형 일양약품 합성실 전무 모친상
- [인사]서울대병원 우홍균 교수,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 취임
- [부음]손태화 한림제약 평가분석부 이사 모친상
- [동정]한국베링거인겔하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인사]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 제26대 대한의학회 회장 선출
- [부음]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부친상
- [동정]전북대병원 채금주·윤선중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학술상 수상
- [동정]위아바임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2년 연속 수상
- [인사]HLB 자회사 엘레바, 김동건 대표 선임
- [인사]서울대병원 우홍균 교수,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 취임
- [인사]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 제26대 대한의학회 회장 선출
- [인사]대전성모병원 이상권 교수, 대한비만학회 부회장 선출
- [인사]고대 안암병원 민재석 교수,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 회장 취임
- [인사]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제11대 의료원장 신홍식 신부 취임
- [인사]서울약대 강건욱 교수,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회장 취임
- [인사]보라매병원 김상완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취임
- [인사]단국대병원 장성욱 충남권역외상센터장, 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장 취임
- [인사]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1/19)
- [동정]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백선하 교수,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수상
- [동정]한국베링거인겔하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동정]전북대병원 채금주·윤선중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학술상 수상
- [동정]위아바임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2년 연속 수상
- [동정]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출
- [동정]녹십자 ‘비맥스’,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5년 연속 수상
- [동정]인하대병원 김장효 교수·조옥민 간호사, 인천시장 표창 수상 ‘응급체계 기여 공로’
- [동정]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동정]인하대병원 백진휘·신승열 교수, 소방청장 표창 수상
- [동정]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 선임













